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

日 저팬포워드, 故 황의원 전 대표 공식 부고기사 게재
태블릿 진실투쟁을 비롯한 각종 진실 탐구에 앞장섰던 故 황의원 전 대표의 영결식이 20일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유력 영자신문인 ‘저팬포워드(Japan Forward)’가 고인을 추모하는 공식 부고기사를 게재했다. 저팬포워드는 19일(현지시간) “Hwang Uiwon, A Defiant Voice for Truth in South Korean Media(황의원, 한국 언론계에서 진실을 위해 저항한 목소리)”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황 전 대표가 지난 14일 사망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미디어워치 전 편집장이자 끈질긴 기자였던 황의원 씨를 추모하며 글을 씁니다(We write with heavy hearts to remember Hwang Uiwon, former Editor-in-Chief of MediaWatch and a tenacious journalist, who died by suicide on November 14)”라고 밝혔다. 이어 “그를 아는 이들에게 황 씨는 뛰어난 필력과 출판인으로만 기억되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는 지성인이자 끈질긴 진실 추구자였으며, 깊은 충성심을 지닌 동료였습니다”라고 고인을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11-20 08:41
-

美 디펜스뉴스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 예정대로 진행”
주한미군은 지난 2월11일 복무기간 연장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군 장병들의 배치 기간을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미군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입국한 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동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 전문지인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미군 장병들의 주둔기간 연장이 한반도 남쪽의 기지부터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15일 “한국 주둔 미군, 장기 주둔 단계적 시행 예정(Army Korea’s move to longer duty tours to come in stages, general say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순환 근무 정상화’ 체계에 따라 이미 병력 이동을 수용하고 있지만, 국내 모든 기지가 장기간 복무를 위한 병사 및 가족들의 수용 준비를 마친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윌리엄 D. 행크 테일러 미8군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부의 기지들이 북부 기지들보다 먼저 복무기간 정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10-18 19:55
-

美 폭스뉴스 "반중시위는 탄압하면서 반미시위는 허용하는 이재명"
이재명 정권의 극좌-반미 성향에 대한 비판이 미국에서 점차 확산되는 조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여당 내부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미국의 자유우파 인사들도 크게 놀라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9일(현지시간)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 안보정책센터(SPC)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한국의 신임 좌파 대통령이 트럼프를 기만하다(South Korea’s new leftist president pulls a fast one on Donald Trump)"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뉴셤 연구원은 서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친미 세력을 강화하고 이 대통령에게 경고할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고 비판했다. 뉴셤 연구원은 트럼프의 자제(restraint)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한국의 우파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윤석열)과 그 부인을 가혹한 환경에 계속 구금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9-30 12:10
-

臺 타이페이타임즈 “美中 대립이 대만 안보에 도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 70여개국은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는 등 그간의 불공정 무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매년 미국을 상대로 약 3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에 미온적이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정면대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연일 군사훈련을 이어가면서 대만 침공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이에 미국도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임시 국방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9일(현지시간) “미-중 경쟁에서 대만의 입장(Taiwan’s stance in US-China rivalr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먼저 사설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전략적 배치가 초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4-19 11:09
-

美 폭스뉴스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용인하면서 1조 달러씩 무역적자를 내야 하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외에서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패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이며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인 빅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이 기고한 “비판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관세 관련 질문 10가지(10 tough Trump tariff questions critics don't want to answer)”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먼저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와 50년 연속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동등화 또는 무역 적자 축소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무역 전쟁(Trade War)’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럼은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과 중국 등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 부과한 비대칭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은 ‘무역 평화(Trade Peac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4-16 09:24
-

美 뉴욕포스트 “미국만 중국에 무역제재를 하는 건 아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즉각 올리는 조치를 9일(현지 시간) 단행하는 대신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되, 사실상의 ‘주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9일(현지시간) 자레드 다우닝(Jared Downing) 기자의 분석기사 “중국은 공장을 늘리면서 물량공세로 미국의 산업을 무너뜨려고 한다(How China has amped up its factories and is threatening to crush US industry with a new ‘tsunami’ of cheap products)”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다우닝 기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서두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쓰나미’가 미국 산업을 향하고 있으며, 그 장본인은 바로 중국(A $1.9 trillion “tsuna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4-10 10:59
-

美 뉴스위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에 대해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대응할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7일(현지시간) 중국 전문가이며 반중인사로 유명한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의 칼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나(China Can't Win a Trade War Against the U.S. for One Simple Reaso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총 관세율은 115%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지금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진핑에게 더 나쁜 소식은 트럼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칼럼은 중국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상품을 과잉 공급하는 약탈적이고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4-08 20:23
-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세계에도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미국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는 중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시했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을 재개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전세계 경제와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지정학 전문가인 로건 웨스트(Logan West) 다뉴뷰연구소 객원연구원이 기고한 “트럼프의 대외 에너지 정책은 승리의 공식(Trump’s Foreign Energy Policy is a Winning Formul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느 국가와 협력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과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던 러시아와 결별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미국의 막대한 액화천연가스(LNG) 매장량과 압도적인 원자력 발전 능력을 감안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4-04 09:16
-

英 스펙테이터 “트럼프가 감당하기엔 러시아의 요구가 너무 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초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이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유력 매체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푸틴이 트럼프를 너무 밀어붙였다(Putin has pushed Trump too far)”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트럼프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해 “화가 났다(pissed-off)”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푸틴이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다면 이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If Putin has any sense at all, he’ll take those words very seriously)”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는 지난 한 달 동안 푸틴은 미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 되었다는 생각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고, 그 동안 우크라이나는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푸틴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4-01 08: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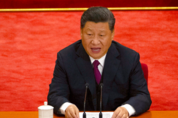
美 페더럴리스트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는 한 중국의 부패는 해결되지 않을 것”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의 가족들이 여전히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과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공산당의 근본적인 부패 의혹을 확인시킨 것이다. 보고서는 부패가 시진핑의 장기집권 때문만이 아닌 중국 공산당 창당 초기부터 존재해 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당의 권력 집중, 투명성 부족, 독립적인 감시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정권의 부끄러운 약점을 드러낸 ODNI의 부패 보고서(ODNI Report On Corruption Exposes Embarrassing Weaknesses In China’s Regime)” 제하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ODNI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전술이 아니라 만연한 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정학적 야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관리들 중 8%에서 65% 가량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25-03-27 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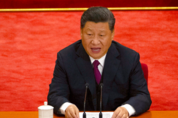
 1
1
 2
2
 3
3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