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

과학에서의 사기 문제와 과학의 권력구조 (2/2)
이전글 :과학에서의 사기 문제와 과학의 권력구조 (1/2) 사례들 CASES 위에서 정리한 일반적 틀의 가치와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호주에서 일어난 과학에서의 사기 및 학적 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 과정에서의 오도, 부하직원 착취하기 및 인사에서의 편향 등과 같은 류의, 이미 관행으로 자리를 잡은 행위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규탄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떤 행동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사례들에만 중점을 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례들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더 ‘심각한’ 사례라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학적 행위에서의 관행은 권력 구조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 의혹 사례 어느 호주 대학교의 과학 학과에서, 어느 우수한 대학원생이 ‘복사해서 붙여넣기(word-for-word)’식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작성한 논문의 대부분 챕터가 각각 다른 출판된 문헌들에서 베껴온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원생의 논문 중 표절을 하지 않은 작은 부분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21 22:54
-

과학에서의 사기 문제와 과학의 권력구조 (1/2)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Scientific fraud and the power structure of science’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아래 논문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크고 작은 연구부정행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부 과학자만의 연구부정행위가 어떤 권력투쟁상의 문제 때문에 발각되고 이후 언론 등을 통해 그 일부 과학자만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의 오도(誤導)가 난무하는 현실을 짚고 있다. 한국에서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조명행 박사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실은 황 박사, 조 박사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여타 과학자들의 ‘위선의 향연’ 문제는 이전부터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으로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이 분야 논문들도 지속 번역소개할 계획이다. 아래 논문은 1992년도에 ‘혁신(innovation)’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에 게재됐다(Vol. 1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21 22:54
-

논문 표절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주안점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Plagiarism : a misplaced emphasis’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권력’과 ‘제도’가 빚어내는 폐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아나키스트로서의 노선을 갖고 있다. 아래 논문은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그러한 노선이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논문으로, 이에 특히 여기서 논의된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zed plagiarism)’ 개념의 경우는 그 한국적 수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권력화, 제도화의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상당수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사이비과학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브라이언 마틴 교수와 같은 아나키스트들(극좌파형이건 극우파형이건)의 권력저항적, 체제저항적 시각이 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아나키즘적 시각이 드러나는 논문들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일부 편집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21 22:53
-

타인의 지적 공헌을 인정해주어라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Credit where it's due’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여러 연구부정행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형태를‘착취(exploitation)’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타인의 ‘공헌(credit)’을 앗아가는 부당저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아래에서 언급된 사건 중에서호주자연사박물관 부당저자 사건과 테드 스틸 교수 부당 해임 사건과 관련 논문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곧 번역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논문은‘캠퍼스 리뷰(Campus Review)’라는 학술지에 실렸다(Vol. 7, No. 21, 4-10 June 1997, p. 11). 사진과 캡션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타인의 지적 공헌을 인정해주어라(Credit where it's due) 누군가의 지적인 과업에 대하여 그 ‘공헌(credit)’을 똑바로 인정해주는 일은 때때로 어렵고 피곤한 일일 수 있다. 허나 공헌을 인정해주는 일은 신입 연구원이나 말단 연구원과 같은 박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17 17:24
-

학적 사기 문제와 호주 학계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Fraud and Australian academics’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아래 논문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이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 여러 연구부정행위 사건들로 떠들썩 하듯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도 역시 여러 형태의 연구부정행위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공적기관인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야말로 더욱 큰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갖가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진실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으로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논문들을 지속 번역 공개할 계획이다. 아래 논문은‘사상과 실천(Thought and Action)’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됐다(Thought and Action (The NEA Higher Education J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15 12:18
-

학적 착취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Academic exploitation’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학계의 여러 부정행위 문제가 학계의 권력구조, 위계질서 등의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학자다. 표절도 결국 착취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기도 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으로 관계 논문들도 차례차례 번역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글은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앤 베이커(C. M.Ann Baker), 클라이드 맨웰(Clyde Manwell), 세드릭 퓨(Cedric Pugh) (편집인들)이 출판한 ‘지적 탄압 : ‘호주 사례의 역사들, 분석과 응답(Intellectual Suppression: Australian Case Histories, Analysis and Responses)’ (Sydney: Angus & Robertson, 1986), pp. 59-62에서 발췌한 것이다.일부 소제목과 사진, 캡션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학적 착취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15 11: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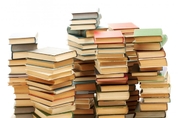
‘불량인용’은 ‘사소한 실수’인가 아니면 ‘표절’인가?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Comment: citation shortcomings: peccadilloes or plagiarism?’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글을 살펴보면 해외 학계에서는 인용 실태와 관계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아탑 내부에서도 표절 검증은 물론, 상호 인용에서조차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학술지 ‘인터페이스(Interfaces)’에 게재됐다(Vol. 38, No. 2, March-April 2008). 아래 글의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불량인용’은 ‘사소한 실수’인가 아니면 ‘표절’인가?(Comment: citation shortcomings: peccadilloes or plagiarism?) 다음은 ‘인터페이스(Interfaces)’지에 발표된 논문인 “옴부즈맨: 인용처리에 대한 검증: 지식의 시트콤 코메디(The ombudsman: verification of citations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11 0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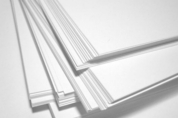
표절 : 컨닝을 막자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촉진하자는 것인가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Plagiarism: policy against cheating or policy for learning?'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캠퍼스에 컴퓨터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학부생들의 표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논문은 호주사회학협회(The Australian Soci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넥서스(NEXUS)’에 게재됐다.(Vol. 16, No. 2, June 2004, pp. 15-16)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인 것이다. 표절 : 컨닝을 막자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촉진하자는 것인가(Plagiarism: policy against cheating or policy for learning?) 요약 Summary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 특히 ‘턴잇인닷컴(turnitin.com)’에 대한 의무적인 사용이 2004년도에 필자가 재직하는 호주 소재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10 23:11
-

대학생들의 표절: 문제점과 몇개의 제안들
※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기고문 ‘Plagiarism by university students: the problem and some proposals’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대학 학부생들의 표절 문제와 그 방지 문제를 다룬 이 글은 울롱공대학교 학생회(University of Wollongong Students' Representative Council)가 발행하는 잡지인 ‘테탄갈라(Tertangala)’에 게재됐다(20 July - 3 August 1992, p. 20.). 사진과 캡션은 모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대학생들의 표절: 문제점과 몇개의 제안들(Plagiarism by university students: the problem and some proposals) 문제점 The problem 표절은 다른 사람의 문장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올바른 인용처리 없이 가져다가 쓰는 것으로, 컨닝행위와 같은 일반적 부정행위의 한 종류다. 일화적 근거를 비롯한 몇몇 연구들에서 학생들의 컨닝행위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10 22:24
-

조국 민정수석 자기표절, 서울대 진실위서 조사 개시
조국 민정수석의 7건에 달하는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서 금번달 3일, 서울대 진실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자기표절 문제는 금년 5월 24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것으로 다음날 25일, 서울대 진실위에 곧바로 제보조치가 이뤄졌던 바 있다. 결국 다섯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장관 석사논문 표절 문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예비조사위원들이 누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질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조사를 질질 끄는 것봐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진실위가 조국 수석이나 김상곤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부정행위 은폐 기구로서의 서울대 진실위의 정체를 국민들과 후학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소득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석사논문, 전문박사논문, 기타 학술지논문 등에서 최소 10여 건 이상의 연구윤리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11-09 1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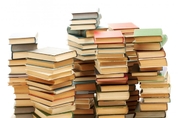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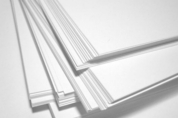


 1
1
 2
2
 3
3
 4
4
 5
5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