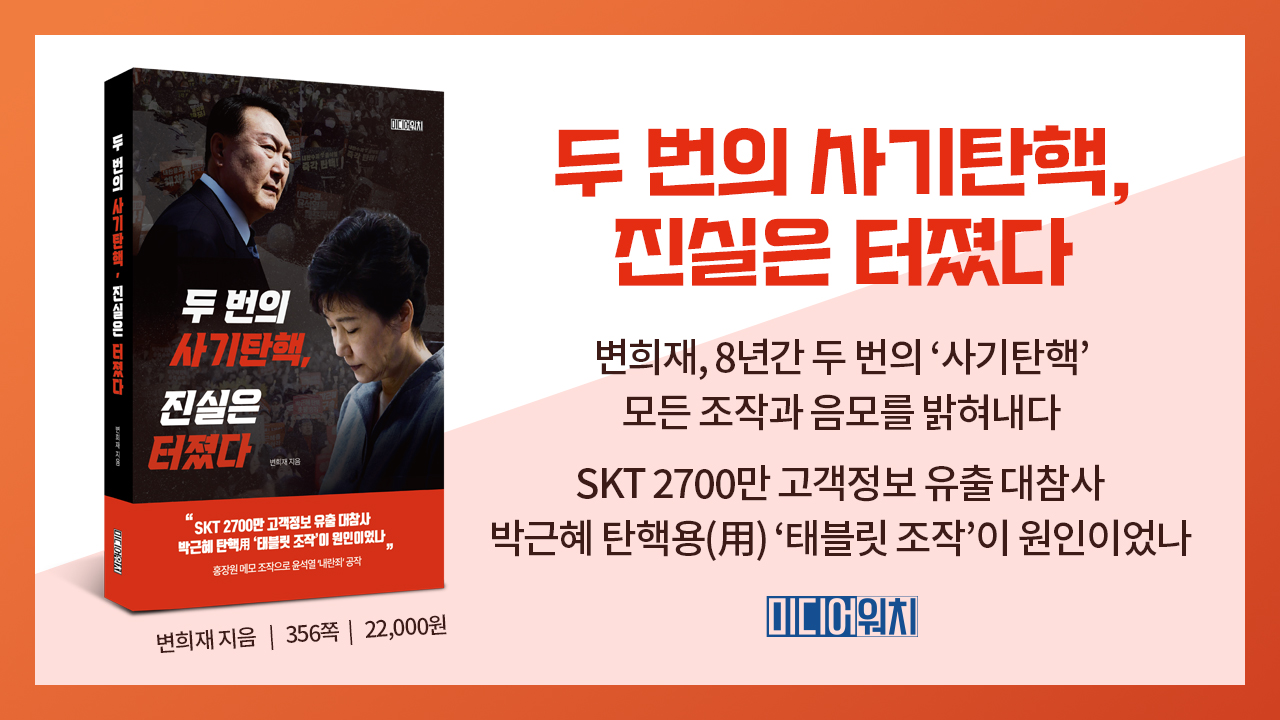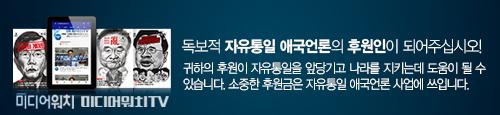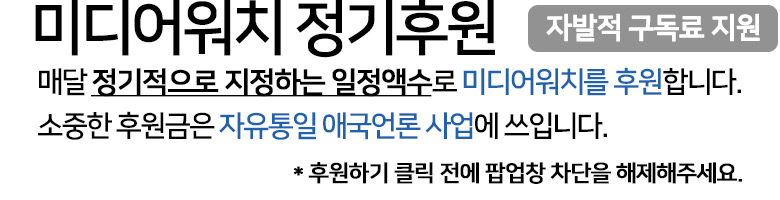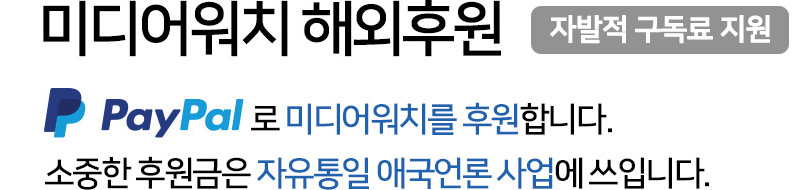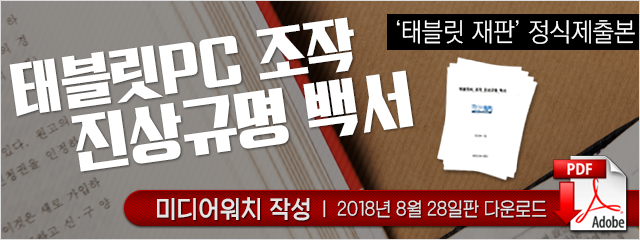(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에 관한 각종 인명사전에는 그의 생몰년을 '1745-?'로 표기하고 있으며 개중 좀 더 자세한 경우에는 '1745-1806?'로 적기도 한다.
의문부호(?)야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죽은 해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김홍도 연구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단행본을 내기도 한 진준현 서울대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앞으로 김홍도가 사망한 시점을 밝혀줄 만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대략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1806년 무렵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1806?'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진 연구관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1806년 이후 김홍도가 살아서 활동했다는 행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현재까지 파악된 그의 작품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늦은 호암미술관 소장 추성부도(秋聲賦圖)가 을축년(1805) 동지 후 3일(음력 12월25일 무렵)에 완성됐다. 셋째, 이 해 겨울 12월에 아들 김연록(金延祿)에게 보낸 편지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언급이 발견된다.
이로 볼 때 진 연구관은 1806년 무렵에 김홍도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홍도 작품이라는 점 외에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늦은 시기에 그려진 점에서도 추성부도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종이에 수묵담채이며, 56.0 × 214.0cm인 이 그림은 보물 1393호로 지정돼 있다.
추성부도는 중국 북송시대 저명한 문필가 구양수(歐陽脩.1007-1072)의 문학작품 추성부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가을밤에 책을 읽다가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며 자연의 영속성과 인간 삶의 덧없음을 노래한 걸작으로 꼽힌다.
김홍도의 추성부도는 집안에 구양수가 있고 동자가 하늘을 가리키는 몸짓을 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 그림 화면 좌측에는 추성부 전문을 단아한 행서체(行書體)로 정성스럽게 써 놓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을축년 동지후 삼일 단구가 그리다"(乙丑冬至後三日 丹邱寫)라고 해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밝히고 있다. 단구(丹邱)는 만년의 김홍도가 사용한 호(號).
그렇다면 단구란 무슨 뜻일까?
진준현 박사에 의하면 신선들이 사는 공간이 곧 단구다. 만년에 접어들면서 건강 악화 등으로 죽음을 예감한 단원의 심정을 대변하는 호가 아닐까 추정되기도 한다. 그의 짙은 도교적 인생관은 단구 외에도 서호(西湖), 고면거사(高眠居士), 첩취옹(輒醉翁)과 같은 별호(別號)에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경기 용인 소재 호암미술관이 자체 미술관 소장품 14번째 테마전으로 마련해 19일 개막한 '그림 속의 글'에 김홍도의 추성부도가 출품됐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 1 모스탄 전 대사 "내란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다" 발언 파장 예상
- 2 이재명의 소녀강간 살해 의혹 제기한 모스탄 전 트럼프 사법대사, 서울대 강연
- 3 강화도 민머루해수욕장 방사능 측정 0.92! 기준치 4배!
- 4 이재명, 결국 미국 영빈관 아닌 워싱턴DC 호텔에 투숙
- 5 트럼프, '친중' 이재명 압박해 결국 총 900조원, 일본 보다 많이 뜯었다
- 6 美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 모스 탄 “유엔 대북제재 위반한 이재명을 제재해야”
- 7 이재명, 호주 앨버니지 총리에 ‘얼평’으로 외교 결례 논란
- 8 [변희재칼럼] 하이브는 방시혁 일당 내쫓고 민희진과 뉴진스를 데려오라!
- 9 자택에서 투신 장시호, 오늘 태블릿 조작 혐의로 법원 증인채택 예정
- 10 트럼프의 나토 회동 요청 거절한 이재명, 이란과 중국 편에 섰나?
-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전화 연락처
- 02-720-8828
- 팩스 연락처
- 02-720-8838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 제보와 의견은 이메일과 팩스로만 받습니다. 전화로는 장애 처리 등 단순 서비스 업무만 처리 가능하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
- 미디어워치
- 포린미디어워치
- 폴리틱스워치
-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 현대사상
- 아카데미워치
- 사이언스워치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